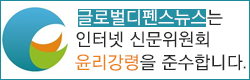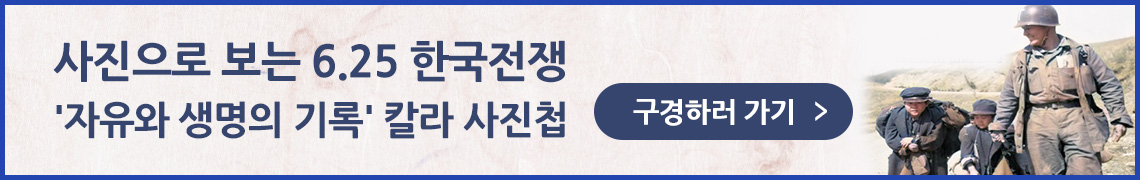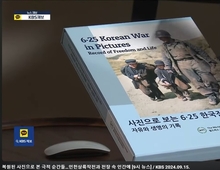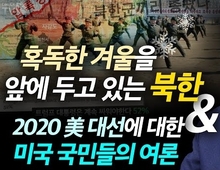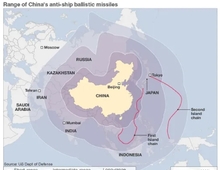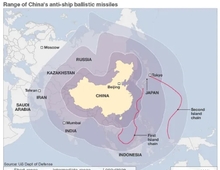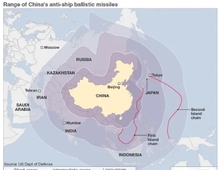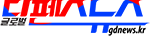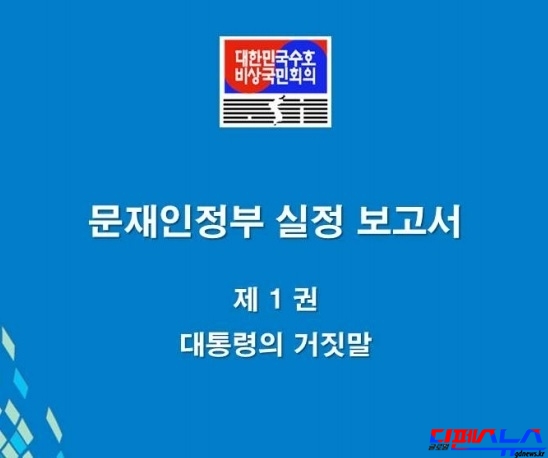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은 법대를 나왔고 법무법인의 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법의식은 각별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가을의 조국 사태와 이번 연초의 검찰인사논란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의 법의식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수사대상에 올랐던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은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도덕적 흠결이 많으면 임명될 수 없는 자리이다.
정부부서를 제대로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비난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에까지 올라있는 인사를 임명했던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부딪쳐 취임 35일 만에 내려오자, 조국의 임명 사례는 나쁜선례가 되고 말았다.
조국의 임명논리에서 보듯 대통령의 법의식은 공허하다. 내재적인 도덕성을 꿰뚫지 않고 외재적인 위법성만 따지려 했으니 말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듯, 외재적인 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내재적인 도덕성이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법의식을 가졌다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가늠했을 것이다.
더욱이 수사대상에 이미 올라있음에랴. 대통령의 법의식은 각료의 법의식을 결정한다. 최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연출한 검찰의 인사대란은 대통령의 법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막상 조국 전법무부 장관에 이어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느닷없이 윤 총장의 법무팀을 ”학살“했던 것이다. 대통령의 법의식이 모순적으로 드러난 셈인데, 점점 점입가경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청 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단행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인사발령을 냈다. 불법논란이 일자, 장관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검찰총장을 항명으로 몰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인사내용을 미리 받아보고 의견을 내려고 하였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럴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기 30분전에 다짜고짜 불러들이려 했던 것이다.
검찰청법의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키려는 수작이었다. 대통령의 공허한 법의식은 이렇게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통령은 이런 모순적인 법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랬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럴수록 고질적일 터이니까 말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던 때였다. 당시에 더불어 민주당의 상임고문이었던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으로 모아져 있는데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기까지 하였다.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인 발언이라 할지라도, 헌법기관을 겁박하는 주장은 지나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올라있을 때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면서도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아리송한 말만 되풀이 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도 승복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 편에 서서 반대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아마도 ‘탄핵이 인용될 때만 승복하겠다’는 말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조건부 승복에 불과하다. 헌재 결정의 헌법적 권위를 충분히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의 법의식에는 법의 실질적 의미보다는 형식적 의미만 살아있고, 보편적 권위로 보다는 권력의 수단으로 각인되어 있다. 서양의 자연법 전통보다는 동양의 법가적 전통에 가깝다.
법가의 한비자는 법을 전제군주의 통치수단, 다시 말해서 폭력수단으로 설파한다. 대통령의 법의식이 걱정스러운 까닭이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독재화될 위험성이 크다.